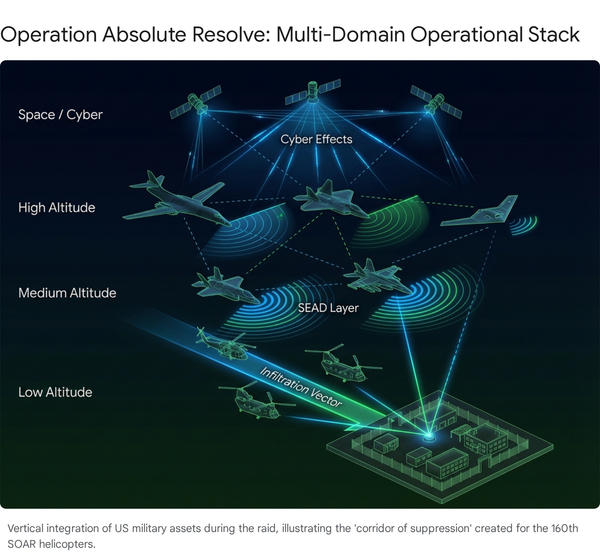미국인들, 미래 대신 과거를 꿈꾼다…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비관적 시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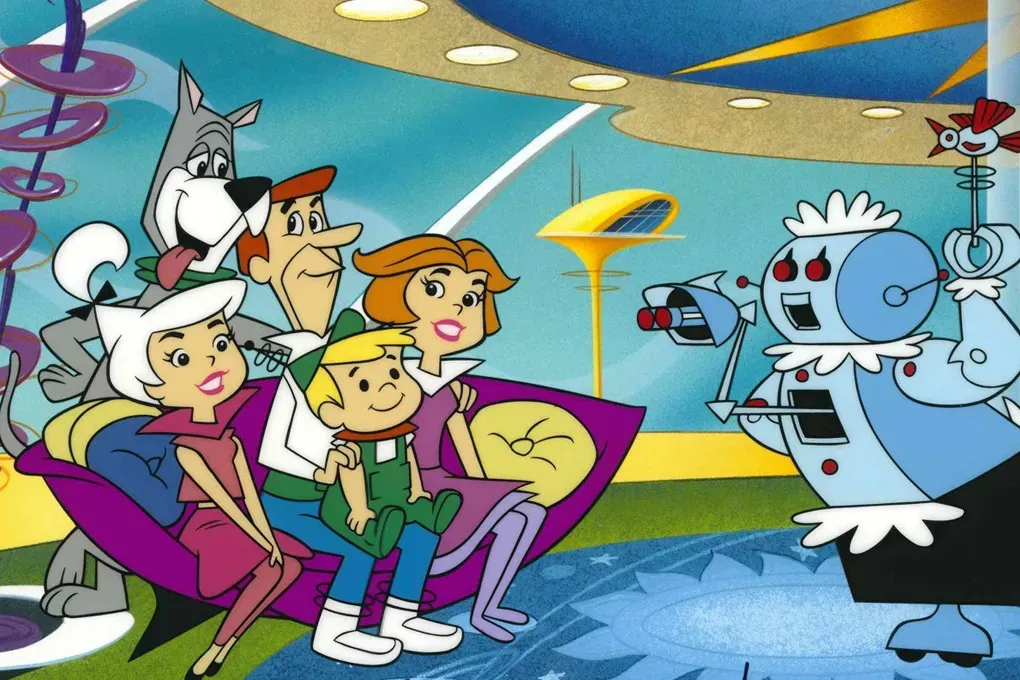
미국인들의 미래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45%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면 과거에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시대를 선호하는 사람은 40%에 그쳤고, 미래를 선택한 이는 불과 14%에 불과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회에서 기술 혁신이 눈부신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미국인들은 미래보다는 과거를 세 배나 더 동경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1962년 방영된 애니메이션 시트콤 '우주가족 젯슨(The Jetsons)'은 2062년을 배경으로 로봇 하인과 비행 자동차가 일상화된 미래를 그려냈다. 주인공 조지 젯은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공장에서 버튼만 누르는 가벼운 업무로 하루 3시간만 일했다. 상사 스페이슬리 씨가 그를 더 일하게 할 때조차 불평할 정도였다. 물론 '우주가족 젯슨'은 진지한 미래 예측이 아닌 가벼운 오락물이었다(가족의 개가 말하는 설정처럼). 그러나 1960년대 초반, 전후 경제 호황으로 중산층이 급속히 확대되고 현대 편의 시설이 대중화되던 시기, 미래는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5년이 2026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러한 낙관은 희미해졌다.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은 '긱 경제(gig economy)'의 파괴적 변화로 위태로워졌다. 예를 들어, 노조화된 택시 기사들의 쇠퇴와 우버(Uber)의 부상은 안정적 일자리의 상실을 상징한다. 기술 진보는 지속됐지만,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안을 증폭시켰다. 특히 인공지능(AI)의 폭발적 성장은 대표적이다.
현재 AI는 불과 5년 전에도 SF 소설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 사회적 영향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AI 슬롭(AI slop)'이라 불리는 저품질 콘텐츠—인간 지능을 흉내 내지만 무의미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의 홍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노동자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이다. 퓨 조사에서 50년 이상 미래에 살고 싶어 하는 응답자는 9%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서 어디에 멈출지, 아니면 몇 정거장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억만장자 기술 거물 피터 틸(Peter Thiel)은 얼마 전 '우주가족 젯슨'의 환상을 빌려 불평했다. "비행 자동차를 약속받았는데 140자(당시 트위터 문자 제한)만 얻었다"고. 2025년 말 현재, 비행 자동차는 여전히 먼 이야기지만, SF 영화 같은 현실은 이미 도래했다. 예를 들어 '프렌드(Friend)'라는 회사는 목에 걸 수 있는 AI '친구' 펜던트를 판매한다. 올해 뉴욕 지하철 벽면 광고는 "저녁 약속을 절대 취소하지 않아" "전 시즌을 함께 몰아보자" 같은 디스토피아적 슬로건으로 도배됐다. 이는 틸의 '기술이 너무 따분하다'는 불만을 구시대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이런 미래가 틸 같은 억만장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음을 드러낸다.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의 1980년대 향수처럼, 청춘의 추억을 되살리는 게 <블랙 미러(Black Mirror)>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보다 나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다.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며, 우리는 모두 시속 1시간의 속도로 미래로 나아간다.
진짜 문제는 이 '버스'를 누가, 어떻게 조종하느냐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불가피하게), 그것이 인간 번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현될 것인가, 아니면 CEO와 주주들의 이익만 챙기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인간 예술을 AI 슬롭으로 대체할 텐가, 아니면 지루한 노동을 자동화해 예술 창작 같은 의미 있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할 텐가? 실업자와 과로자로 양분된 사회에서, 후자들이 AI 펜던트에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미래를 방관할 텐가, 아니면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전 국민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진짜 인간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칠 텐가?
이 질문들의 답은 기계의 종류가 아니라 소유권에 달려 있다. '우주가족 젯슨'의 가장 비현실적 요소는 비행 자동차나 말하는 개가 아니라, 스페이슬리 씨가 직원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만큼 후한 급여를 주면서 주 3시간 근무를 허용한 점이다. 대부분을 해고하고 남은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는 게 더 비용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2025년,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2024년처럼)는 이 '자비로운 자본주의'와 현실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 자원이 부유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유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자원이 대다수 국민의 이익과 충돌하는 소수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은 복잡한 논쟁거리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현재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경제 구조가 기술의 방향성을 좌우한다면, 1980년대로의 퇴행을 꿈꾸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혁신 구현과 공동체 삶의 배열을 모두가 결정하는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미래는 살기 좋은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 기술은 이미 우리 발밑에 있다. 문제는 그 방향을 누가 쥐느냐다.